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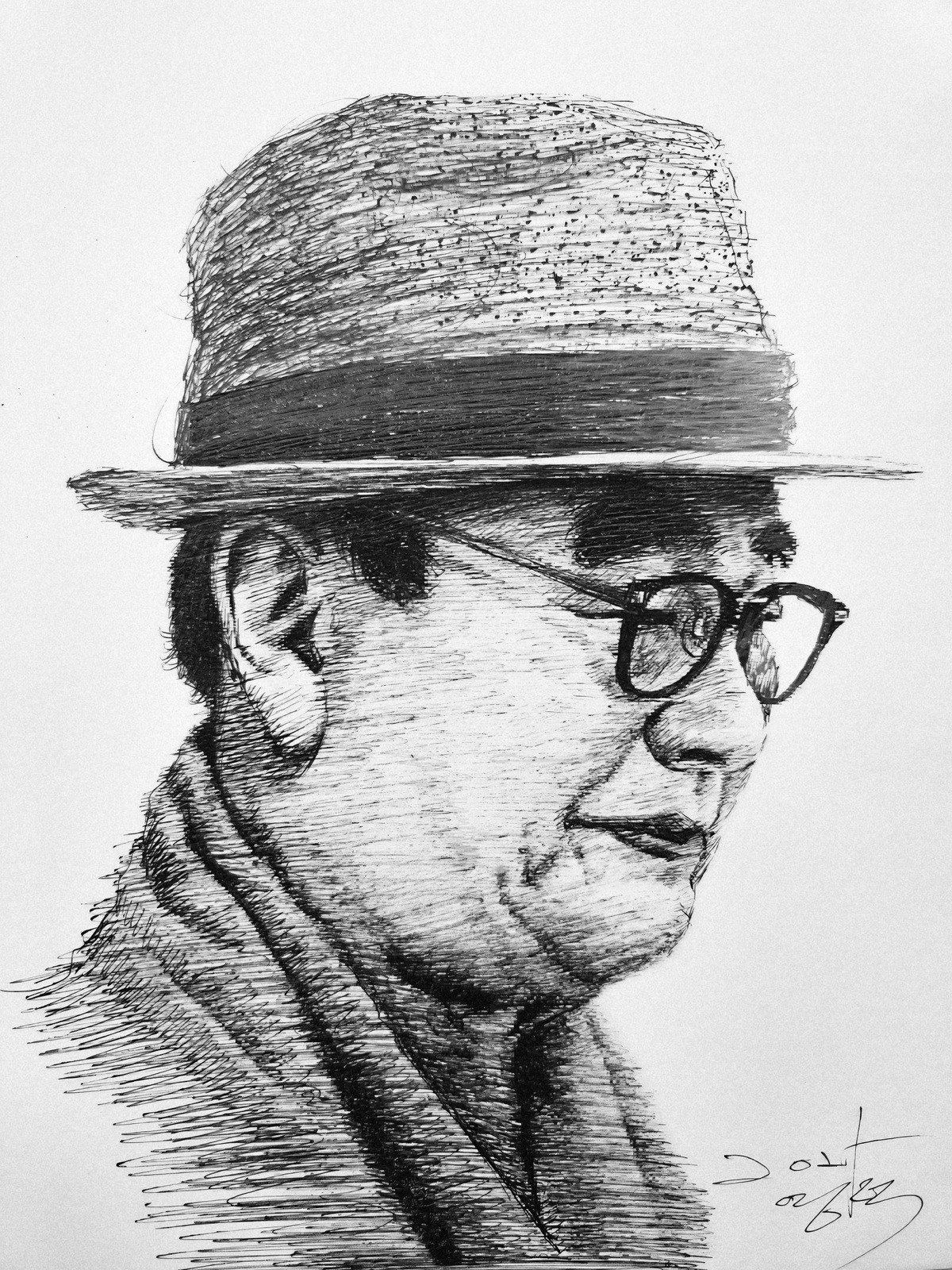
컴퓨터는 세상과 통하는 나의 창이요 날마다 열리는 ‘희로애락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 전원을 켜는 일이다. 이메일 확인, 카페 출석 체크, 신문 헤드라인까지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주무르는 느낌!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세계 일주를 하는 셈이다.
요즘은 특히 내가 가입한 카페의 ‘말꼬리 잇기’ 코너에 푹 빠져 있다. 이 코너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 달리기 경기장’이다. 누군가가 던진 말의 꼬리를 붙잡고 나는 말머리를 만들며 질주한다. 어찌 보면 말의 줄다리기요, 또 어찌 보면 말장난의 향연이다.
예를 들어 어부바-바이오-오렌지-지필묵-묵사발 식이다. 묵사발에서 ‘발로 차지 마!’라고 이어가는 회원도 있고, ‘발끝에 피어나는 봄’으로 시인처럼 쓰는 사람도 있다. 말 그대로, 말의 무한 확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신개념 놀이문화다.
회원들은 대부분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이 닉네임들이 또 기가 막히다.
‘물레방아’, ‘굼뜬 소’, ‘군자 향’, ‘수선화’, ‘바람의 언덕’, ‘등등.
이쯤 되면 카페라기보다 조선시대 시문(詩文)모임 느낌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말 달리기’는 시작되었다. 회원 ‘대봉 군자 향’이 퀴즈를 하나 냈다.
“달 밝은 밤에 대봉 군자 향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다 말고 갑자기 캄캄한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선 모습을 여섯 글자로 묘사하시오!” 맞추면 상품이 있다고 하자
순간, 모두의 손가락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이건 퀴즈인가, 수수께끼인가, 아니면 문학평론인가.
어떤 이는 ‘서울대 인문계 2025학년 수시 논술 문제 같다’고 하고, 다른 이는 정답 ! ‘달 어디로 갔노’ 하며 외친다.
‘달이 밝디 마는’, ‘와이리 어둡노’, ‘멍청한 군자 향’, ‘상품에 눈멀어’ 등등.
차라리 국립국어원에서 회수해 가야 할 해학의 향연이 펼쳐진다.
‘달 밝다’ 했다가 ‘캄캄하다’고 하니,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지만, 이 코너에선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바보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 문제는 스님이 화두로 잡고 십 년은 정진해야 풀릴 문제”라고까지 했다. 출제자는 거기에 또 한마디 얹는다.
“문제가 어려웠다면, 여러분 수준 탓이 아닐까요?”
그 말에 카페는 조용한 분노(?)와 유쾌한 웃음이 동시에 터졌다. 분명 기분 나쁜 말인데도, 다들 웃고 넘어가는 걸 보니, 이곳 사람들은 참 너그럽다.
마침내, 한 회원이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여섯 글자를 올렸다. 정답이었다.
순간, 카페 전체가 뒤집어졌다. 그 정답은 철학적이면서도 해학적이고, 군자 향의 내면을 절묘하게 저격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답을 맞힌 회원의 닉네임은 ‘바람의 언덕’이었는데, 정답자는 일부러 ‘바람난 언덕’이라고 발표했다. 이쯤 되면 유머인지 모욕인지 헷갈리지만,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다. 이곳은 그 어떤 말도 유희가 되는, 말의 자유국이다. 사실, 끝말잇기라는 게 시시콜콜한 말 따먹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언어 감각을 키우고, 발상의 전환을 배우며, 창의성을 기르는 훈련이다. 한마디로 ‘말장난’을 가장 진지하게 하는 곳이다. 어쩌면 작가 지망생, 시인, 개그맨의 전초기지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이 창(窓)을 연다.
오늘은 또 어떤 말꼬리를 잡을까? 어느 회원이 ‘사이다’ 같은 말로 나를 웃게 만들까? 농담 따 먹기라 해도 좋다. 그 가운데서도 순 기능은 있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