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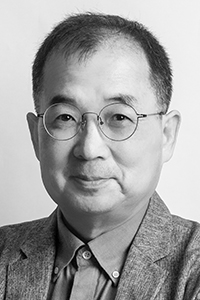
2025년이 열흘 남짓 남았다. 우리는 한 해를 ‘실패한 계엄’이 남긴 상처 입은 민심과 함께 보냈다. 총과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발상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도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허약하다. 무너지지 않았을 뿐, 단단해졌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흔히 밖에서 들여온 제도쯤으로 여겨왔다. 교과서 속 개념이고, 헌법 조항이며,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이상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은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이식된 장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일상의 자리에서 벽돌처럼 하나씩 쌓아올린 구조물이었다는 것을. 광장에서, 직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론장에서 국민은 스스로 민주주의의 기둥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쪽은 오히려 기득권 엘리트들이었다. 국가와 질서, 안보와 위기를 앞세우며 헌법의 근간을 주무르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언제나 거창했지만, 그 끝에는 권력의 연장이라는 낡은 목적이 놓여 있었다. 반면에 이들을 막아낸 것은 아무런 직함도, 무기도 없는 국민들이었다. 제복도 계급장도 없이, 다만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라를 지켰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아득했던 길목마다, 악한들은 움켜쥔 자리에 남아 있었다. 민주주의의 건강한 전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퇴장하지 않았다. 실패했을 뿐이다. 제도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시민의 피로와 망각을 치밀하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다.
민주주의는 단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씩, 조용히, 일상 속에서 마모된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는 신경줄을 놓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완성 상태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잠시 방심하여 ‘설마’하는 사이에 균열은 벌어진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헌법상 문장은 조문으로 남을 때 가장 위태롭다. 살아있는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감시와 참여, 질문과 비판이 필요하다.
지켜냈다는 안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킨 다음에도 눈에 불을 밝히는 국민이어야 한다. 권력의 언어를 해독하고, 제도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며, 불의가 상식으로 둔갑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의에 기대어 작동하지 않는다. 경계와 참여, 기억과 행동 위에서만 호흡을 이어간다. 2026년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지켜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 ‘불편한 책임’을 내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우리를 떠난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언제나 되돌리기 어려운 후회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어느 틈에 경제적 선진국으로 올라섰듯이,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 공동체가 민주와 평화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것인지를 이제는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 해를 넘기며 우리는 각오와 다짐을 새로이 하여 나라와 국민이 공동체적 생명력을 이어가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